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기업 전략:
선택 아닌 '생존전략'의 시대, 본격화되는 국내 ESG
THE CSR ESG Issue Brief | vol.2 | June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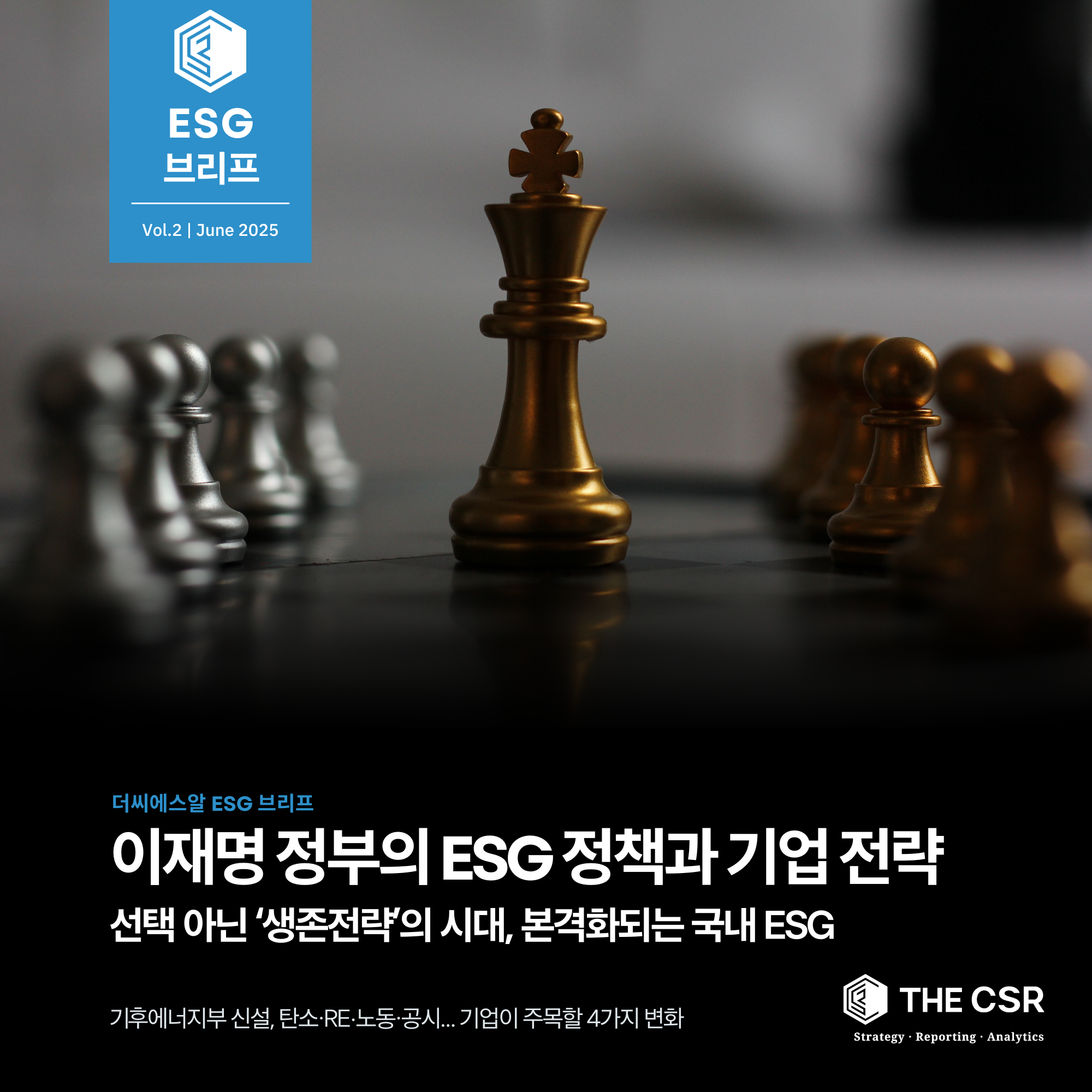
SUMMARY
- 우리나라 ESG의 ‘룰 세터(Rule setter)’ 지향… ‘기후에너지부’ 신설
- 탄소감축 법제화 가속화…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 재생에너지 인프라 대전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2030년 완공 목표
- 노동 입법 변화와 ESG 공시 의무화, ESG가 기업 생존을 가른다
친환경정책을 넘어, ESG 정책의 Rebalancing(리밸런싱)을 통한 룰 재편
국민주권정부를 기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민간 자율에서 법제화로, 원전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환경 중심에서 포용적 ESG(노동, 사회, 중소기업 포함)로 리밸런싱(rebalancing) 차원의 정책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ESG 경영 확산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친환경 전환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정책을 넘어, 리밸런싱을 통한 기업 경쟁 룰을 재편하는 ESG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5,254건의 법안 중 797건1이 ESG 관련 법안이며, 지난 3월 26일에는 국회에서 기후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제도화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 ESG정책 대응 4가지 포인트
🌿탄소 감축목표의 명확화: 탄소감축·관리 방향성 점검 필요
이재명 정부의 탄소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는「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입니다.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전면 폐지하고 산업단지의 RE100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 2월까지는 중간 목표를 명시한「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는 장기적 선언이 아닌 실행 가능한 중기 전략으로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이지만, 2024년 9월에 발표된 ‘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대비 14% 감축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석탄·가스 발전 퇴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배출권거래제 또한 개편할 예정입니다.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증액할 계획이며, 특히 2026년~2030년의 배출권 할당 계획에서는 25% 기준을 중심으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환경계에서는 100%로 확대 주장)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탄소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한편, 지난 5월 28일 EU집행위원회가「EU 기후법」에서 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1990년 대비 55%)에 거의 근접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7개국이 제출한 ‘국가 에너지·기후계획’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4% 감축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현황은 이재명 정부의 탄소 감축목표 정책 추진에 더 큰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업 직·간접 사업 기회 모색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와 제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과 해저 송전망을 구축하여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성하고, 2040년까지는 국토 전역을 U자형 해저전력망으로 연결하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계통 안정화 설비,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서해를 가로지르는 최첨단 해상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system, 고압직류송전망) 그리드, 그리고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를 하나로 연결하는 포괄적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수출 대상국의 탄소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글로벌 RE1002과 K-RE100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제도 또한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 2025년 6월 12일 발의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기업에게 최대 60개월간 송·배전설비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민간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하거나 민간사업자로서의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노사관계 변화 예정: 컴플라이언스 강화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필요
노동정책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변화, 임금체계 개편, 노동법 개정,「중대재해처벌법」 등 입법 변화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많은 노사관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로 주 4.5일제 추진,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 확대, ‘산업안전보건공시제’3 단계적 도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의 근로기준법 명시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핵심 공약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포함한「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노동시간, 임금, 산재 관련 리스크를 포함하는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에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시, GRI Index의 △고용 △노사관계 △다양성과 기회균등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항목과, ESRS Index의 임직원과 가치사슬 근로자 관련 항목도 주의 깊게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ESG 법제화의 시간: ESG를 경영전략에 통합할 때
이재명 정부는 ESG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ESG 도입 및 확산지원법(가칭)’과 ‘중소기업 탄소중립지원법’ 제정 추진이 그 예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보증, 투자 등 금융 지원 시 기업의 ESG 성과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 탄소중립지원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추진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반 구축, 에너지 전환·친환경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도 조기 도입할 예정이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화, ESG 워싱 방지, 측정 및 평가 인프라 개선 등 정보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ESG 대응을 강제력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Say on Climate’ 제도 도입을 통해 상장기업이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감축목표, 이행 현황 등을 주주총회에서 표결 안건으로 삼도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기업은 ESG를 규제가 아닌 '생존전략'으로 받아들여야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은 단순한 규제 도입이 아닌 ‘산업생태계 재편’을 지향합니다. 탄소감축 법제화, 기후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ESG를 선택이 아닌 ‘시장 참여의 기본조건’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NDC 제출, 공시 의무화 등은 기업의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RE100 참여, 공시 시스템 대응 등이 제도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ESG는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활동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및 ESG 정보공시의 제도화 흐름은 향후 회계감사와 기업평가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ESG를 생존전략으로 삼고 체계화한 기업만이 경쟁력을 갖추게 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 1.‘2025 지속성장전략포럼’, 김동수 김앤장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 2025.5.29.
- 2. ’25년 4월 기준으로 한국기업 36개, 글로벌 기업 446개 가입(출처 : The Climate Group, CDP)
- 3.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투자규모,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차년도 활동계획, 사고사망 등 산재발생 현황,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계획 등을 공개
- 4.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
- 5.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자사로 한정한 것과 유사
참고문헌
-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025.5.28.
-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당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
- 에너지 고속도로, 민주연구원. 2025.5.29.
-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2025.6.4.
- 열린국회정보(https://open.assembly.go.kr/portal/mainPage.do)
더씨에스알 ESG 브리프는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실행에 필요한 글로벌 핵심 이슈를 분석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발행됩니다. ⓒTHE CSR ESG Research Center